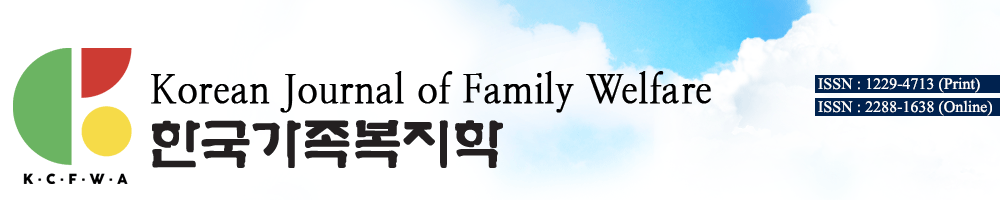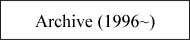ISSN : 2288-1638(Online)
중년독신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f Unmarried Middle-Aged Women’ s Perceptions and Preparation Efforts for Successful Aging
Abstract
- 2호6.강정희.pdf458.6KB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는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미혼 남녀의 증가 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이어져 고령화 사회의 촉진과 아울러 그에 수반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청년세대의 부정적 인식은 앞으로 독신 가구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들며, 이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전통적 가족모델에 의거한 복지대책만으로는 누수 되는 문제들을 포괄할 수 없어 심각한 취약성이 드러날 것이다.
특히 미혼 여성의 증가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2011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모든 연령층에서 미혼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주 혼인연령층(25-34세)의 여성 미혼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25-29세는 10.2%(59.1%→69.3%), 30-34세는 10.1%(19.0%→29.1%)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생애 미혼율로 간주할 수 있는 45-49세 여성의 미혼율도 2005년 2.4%에서 3.3%로 증가하였다. 2010년 40세 이상 미혼 여성의 수는 30만명에 달하여 이는 2005년 178,000명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통계청, 2011).
우리나라보다 앞서 미혼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단순한 미혼율의 증가세보다 생애 미혼율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50세 시점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의 생애 미혼율이 1990년 4%에서 2010년 9.8%로 증가하여 10명중 1명이며, 20년 사이 2배나 증가하였고, 일본정부(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인구동향연구, 2010)는 2030년 여성의 생애미혼율을 22%로 추산하고 있다(하보란, 2011:7).
2011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애미혼자 수도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 6만 1,176명에서 2005년 12만 1,600명, 2010년 23만 9,707명으로 10년 전에 비하여 4배 이상이다. 이는 일본이 20년 사이 2배 이상의 여성 생애 미혼율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여성 생애미혼 증가율은 심각한 우려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생애미혼율의 급격한 증가추세는 머지않아 노년기 독신 여성의 인구수의 급증과 연결되며 이는 여성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된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지칭하는데, 통계청(2011)의 ‘2011 고령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노인 인구수가 14.4%에 달해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며, 2026년경이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여성이 322만7000명(59.5%)이고, 남성이 219만8000명(40.5%)로 여성 노인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0)에 의하면 여성노인(34.2%)이 남성 노인(17.0%)보다 2배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여성노인이 노년기에 빈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7년이나 더 긴 여성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금의 중년 미혼 여성이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20년 뒤에는 여성 독거 노인 문제는 단순한 수적 증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질 문제와 중첩되어 무엇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년 미혼 여성의 성공적인 노후생활과 관련해서 폭넓은 관심은 물론 다층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중년 미혼 여성을 생애미혼자로서 고독사 예비군으로 지정하여 학계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노년기로서의 준비 과정에 들어선 40-50대 중년기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관심은 다소 비켜 서 있는 듯하다. 대부분의 중년기 연구물들은 신체적 질병이나 건강과 관련한 주제들로 편향되어 있고 이마저도 중년기 기혼 여성들의 삶과 노후생활에 대한 연구(박금자, 2002; 박형숙 외, 2003; 송석전, 2003; 김인숙, 2004; 박정희, 2007; 고정옥․김정숙, 2009; 안현선 외, 2009)로 이루어졌으며, 중년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다. 이것 역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인구학적 배경에서의 현황분석(유수민, 2006; 김은설, 2009; 한국 노동연구원, 2011)이 주를 이루는 조사보고서이며, 중년 미혼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들여다보기를 시도한 질적 연구 논문들 역시 (심경미, 2002; 양은주, 2005; 권미형 외, 2009; 채재희, 2010)극소수이다. 이들 논문도 중년 미혼 여성의 결혼관이나 일상의 삶에 대한 탐색을 한 것이기에 중년 미혼 여성의 노후생활과 관련된 질적 논문은 현재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 미혼 여성의 시선과 목소리로 그들의 노년기를 조망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기혼과 노년기 성인들로 국한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중년 미혼 독신 여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가족중심과 결혼지향적인 한국문화 속에서 독신으로서 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독신여성의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개입하고, 더불어 중년독신여성들이 성공적 노화를 적절히 준비할 수 있는 예방교육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설계하는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2. 연구문제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것을 바람직한 삶의 형태로 인식하는 한국의 문화에서 중년의 독신 여성들은 결혼제도 밖의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있기에 그들의 성공적 노년 생활에 대한 조망도 결혼제도가 전제된 인식틀로 바라보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 문화에서 배우자와 자식이라는 인간관계 없이 살고 있는 독신들의 노화에 대한 준비는 기혼자들과 다를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신인구의 증가율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중년 독신 여성의 성공적 노화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의 경험이 없는 중년독신여성들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미혼의 중년독신여성들은 노화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둘째, 이들에게 성공적 노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이들은 성공적 노년생활을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아울러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문제에 응답해 가는 과정에서 ‘중년독신’이라는 사회적 지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중년독신여성의 의의와 특성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중년기는 청년기의 다음 단계이자, 노년기의 직전 단계로, 어느 연령대를 중년기(middle adulthood)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년기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지기 때문이다. Havighurst(1972)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와 노화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 기준으로 중년기를 대략 35-60세로 정의한 반면 Neugarten(1968)은 사회적 지위 및 역할과 관련하여 40-70세를 중년기로 설정하였다. Erickson(1994)은 생애발달단계에 따른 정체감 형성 및 달성해야할 심리적 과업과 연관지어 34-60세를 중년기로 구분하였다. Staudinger 와 Bluck(2001)은 중년기를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생애 과정의 특징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중년전기(early-midlife:40-50yrs.)와 중년후기(late-midlife:50-60yrs.)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중년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40-60세로 보고 있으며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성인 단계를 일컫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년기에는 신체적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청년기의 건장함과 유연성이 퇴색하고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암 등의 성인병이 발병하기 시작하며, 과도한 직장업무로 인한 과로사도 발생하기 쉬운 연령대이다. 여성의 경우 중년기가 되면서 여성호르몬의 변화가 시작되어 갱년기를 겪거나 폐경기를 맞게 되면서 성적 매력이 감소하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생산능력의 상실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를 경험한다. 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한 중년의 위기(mid-life crisis)를 경험할 수 있으며, Troll(1982)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문제 등으로 인해 더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년기는 직업적 성취도도 최고조에 이르는 반면 직업적 전환을 해야 하는 위기도 공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인한 긴장이 다른 시기보다 많은 편이다(권중돈·김동배, 2005:192). 뿐만 아니라 40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직업적 성취를 위한 열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긴장도 높은 편이며 이를 위해 직장의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정과 신임을 얻기 위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해야하는(김태련· 장휘숙, 1998; 권중돈·김동배, 2005) 시기이기도 하다.
Erickson(1994)은 중년기를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타인의 욕구를 예측할 수 있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 이 단계에서 건강한 성인이 달성해야 할 발달 과업을 생산성(generativity)으로 보고 있다. 생산성이란 자녀 양육의 의미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활동이나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직업 영역에 있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투입시키며, 더불어 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질 때 생산적 시기를 보내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 침체되기 쉬우며, 다음 단계인 노년기에서 성공적 노년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장애를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중년기 미혼 여성의 경우 위와 같은 중년기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중년의 여성으로서의 위기감과 중년이면서 미혼이라는 이중의 제약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2. 성공적 노화의 정의
‘성공적 노화’ 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령/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거나, 곧 경험하게 될 서구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측정하는 방식은 각 학자들의 관점과 이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주로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유리이론(disengagement), Baltes(1993)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SOC 모델)이 성공적 노화 개념을 이루는 주요이론들로 논의된다.
활동이론은 활동의 지속과 상호관계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측면임을 가정하고(Verena, 2003), 유리이론은 성공적 노화를 연령에 따라 활동과 역할로부터 물러나는 것으로 정의한다(Fredrickson &Carstensen, 1990). 선택적 적정화 모델은 앞의 두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론으로 평가받는데, 노인과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따른 노인의 활동수준이나 일관성 있는 삶의 유지노력이 나타남을 주장한다(Baltes, 1993).
활동이론의 맥락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성공적 노화 모델은 Rowe와 Kahn(1998)의 개념으로써, 이들은 성공적 노화를 세 가지의 행동특성으로 개념화하는데, 첫째, 질병 및 관련 장애의 위험이 낮은 상태, 둘째, 높은 수준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 셋째,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참여를 포함한다. 유리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Conscious aging은 과거의 역할로부터의 단순한 유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유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은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이나 목표를 선택해서 그와 관련된 기술을 적정화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부족함을 보상한다는 이론으로, Baltes(1993)는 수명,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적 효능감, 사회적 유능성과 생산성, 개인적인 통제, 생활만족도를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 제시하며, 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적 적정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성공적 노화는 개인-환경 간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과정의 결과로써 개인의 환경 맥락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측면, 정신적/심리적 측면, 인지적 측면에서의 건강과 유능성,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 측면에서의 적극성과 활동성, 생활만족도나 삶의 의미 추구라는 측면에서 개념화되어지고 있으며, 성공적 노화의 획득은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의 요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1) 중년독신여성에 대한 선행연구
중년독신여성 인구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중년기혼여성에 대한 연구에 비해 연구물의 양적 측면이나 질적 측면이 미흡한 편이다. 그럼에도 중년독신여성 집단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다양한 연구주제로 표출되고 있다.
권미형 외(2009)는 중년 미혼 여성의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에서 중년 미혼 여성의 삶의 만족감 유형을 ‘자기만족형’, ‘부담형’, ‘자기중심적 생기형’, '결혼 희망형‘으로 구분하면서 이 유형들의 공통점으로 경제적 능력과 여가생활 및 직장 생활, 사회적 활동이 삶의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심경미(2002)의 연구에서도 중년 미혼 여성은 결혼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관심분야,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 자유로움과 독립성 등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50대 고학력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은주(2005)의 생애사 연구에서도 중년의 미혼 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으며, 결혼보다는 경제적 독립과 실질적 노후대비에 대한 욕구가 더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미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통계청의 조사결과들이 있는데, 2011년 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보고서에 의하면 성인미혼여성(20-49세)들은 결혼을 생의 주기에서 경험해야 할 필수 과정이 아니라 선택일 뿐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9.5%에 불과하며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7.1%이다.
 표 1. 미혼 성인 여성의 결혼에 대한 견해(2010)
표 1. 미혼 성인 여성의 결혼에 대한 견해(2010)
한국노동연구원(2011)의 ‘학력과 경제활동 상태로 본 40대 미혼’에 대한 연구조사에서도 40대 미혼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미혼자와 남성 미혼자의 학력의 특성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고학력 미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의 미혼자들은 경제활동 영역에서 상용직이거나 고용주가 많았다. 이는 김은설(2009)의 ‘우리나라 미혼 성인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식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혼 여성의 연령대 중 40대 이상의 중년 독신 여성이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율(47.0%)이 가장 높았으며,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개인적 삶을 즐기고 싶다(33.3%)'가 가장 많았고, 아예 결혼에 무관심하다는 응답이 28.9%, 타인과의 동거가 힘들 것 같다는 응답도 22.2%였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자신의 개인적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은 결혼으로 인한 가족의 유지와 부담감이 기혼의 생활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년 미혼 여성들의 개인적 삶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들은 문화와 여가 부분에서 20-49세 미혼 여성의 88.9%가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관람하는 등 미혼 여성의 문화생활 향유가 기혼여성이나 남성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문이나 독서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에도 88.6%나 참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보다도 사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신문 구독비율도 90.1%에 달했다(통계청, 2011).
또한 미혼 여성은 자녀나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가정 내 돌봄 노동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서 해외여행의 비율 역시 기혼 여성보다 높았으며, 가정생활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 역시 미혼여성(37.9%)이 기혼여성(64.4%)의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 개인의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가족이 있는 기혼여성의 건강관리 실천율이 미혼여성보다 모두 높았는데 각 항목을 살펴보면 미혼 여성은 ‘아침식사를 거른다’는 경우가 절반(46.7%)이나 되었으며 규칙적 운동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76.7%)이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에서도 74.9%가 응답하여 기혼 여성의 응답율(57.0%)보다 높았다. 이는 기혼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개인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식하며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미혼여성들은 혼자라는 생각에 자신에 대해 다소 무관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미혼 여성들은 배우자의 부양을 받거나 배우자 연금혜택을 함께 누릴 수 없기에 안정적 소득 확보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은 곧 독신의 미혼여성에게는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안정성’과 ‘수입’, ‘보람’과 ‘자아성취’ 항목을 우선순위로 채택하였다.
전반적인 사회관계망 형성에서도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혼여성의 경우 ‘도움 받을 사람 있음’이 85.7%, ‘이야기 상대가 있음’이 92.4%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2010)에 의하면 29세-44세의 한국 미혼 여성의 특징으로 고학력, 안정적인 직장 등의 특성을 꼽으면서, 초대졸 이상이 76.9%이며, 취업여성이 96.5%이고, 과반수 이상이 일반사무직 및 관리직종(62.9%)에서 정규직의 지위(75.1%)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선행연구
기존 성공적 노화의 논의가 서구 노인들의 삶과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및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탐구하는 것들(박경란·이영숙, 2002; 홍현방, 2002; 강인,2003; 김숙자, 2003; 최인영, 2007; 김미령, 2008; 윤현숙 외, 2008)과, 한국 노인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성공적 노화의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한다(김미혜·신경림, 2005; 최혜경 외, 2005; 김동배, 2008; 안정신 외, 2009).
특히 개발되어 현재 사용되는 척도들은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함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 척도들의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미혜‧신경림(2005)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 하는 삶’을, 김동배(2008)는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을, 안정신 외(2009)는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을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요약한다면 대체로 한국노인들은 자기효능감이나 자기통제감의 획득을 통한 개별적 삶의 만족을 성공적 노화의 한 측면으로 인식하고, 자녀관계나 부부관계의 만족을 통한 가족관계적 삶에 대한 성공을, 성공적 노화의 또 다른 중요 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상 검토되어진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중년층과 미혼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고 있다. 40대와 50대에 걸친 중년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연구(박경란·이영숙, 2002; 김숙자, 2003; 최인영, 2007; 안정신 외, 2009)가 소수 나타나는데, 안정신 외(2009)는 예방적 차원에서 노후생애 교육과 실천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성공적 노화의 연구대상이 중년기까지 확대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 문화에서 독신들의 노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는 기혼자들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개발된 성공적 노화의 척도가 중년기 성인들에게는 부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안정신 외, 2009), 성공적 노화의 중심요인으로 가족에 뿌리를 둔 자존감, 특히 부부관계와 성인자녀의 중요성을 논의한 기존 연구(김미혜‧신경림, 2005)는 독신자들에게 적용하여 일반화시킬 수 없다.
둘째.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척도개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한 반면, 성공적 노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의 부족이 아쉽다. 노년층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중년기와 초기노년기를 살아가는 성인들을 망라하여, 그들의 성공적 노화 달성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로 결혼 경험이 없는 중년 40-50대의 미혼 독신 여성들의 노화에 대한 인식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준비과정의 경험을 삶의 맥락에서 풀어내었다. 심층 면접은 양적 연구에서 놓칠 수 있는 연구 참여자가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세계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기에 실존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낼 수 있으며, 개인적인 맥락과 경험에서 부딪치는 변수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입에 들어선 중년의 미혼 독신 여성들로 생애미혼자로서 앞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나 의지보다는 남아있는 삶을 더 향유하면서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성공적인 노년기 생활에 대한 의지와 욕구를 가진 여성들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우리사회에서 나이든 미혼 여성들의 사회학적 특성인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과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 자립 상태인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로 선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연구의 주제에 대하여 통찰과 발견을 얻을 수 있도록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였다. 눈덩이 표집법은 비확률표본추출기법으로서 질적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본추출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정 모집단의 구성원을 찾기가 어려울 때 대상 모집단 중에서 찾을 수 있는 소수의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에 응한 구성원의 소개로 모집단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상자를 축적하는 방식이다(Rubin &Babbie, 2001:255). 본 연구에서도 최초 인터뷰에 응한 대상자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추천받아 축적된 표본집단 10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자료의 포화가 이루어진 7명이 연구 참여자로 분석대상이 되었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먼저 연구주제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하여 미혼 독신에 대한 폭넓은 문헌 고찰과 생활세계에서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획득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작성한 현장일지와 메모 등 다양한 원자료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기도 하였다. 면접은 연구 참여자의 집이나 참여자가 일하는 직장 근처의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가 진행되기 전 평소 알고 지내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던 연구 참여자와 사전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와 만남을 가졌다. 면접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회 면접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 거주지가 부산, 진해, 창원, 통영, 장유 등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개인별로 2회-4회 등 만남의 횟수가 달랐지만 자료의 포화상태를 위하여 심층 면접과 전화통화 및 메일을 이용한 서신교환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충하였다. 면접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었으며 녹취록 작성 시 면접자의 비언어적 요소들까지 모두 기록하였다. 또한 면접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및 연구자에 대한 관찰은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3. 자료 분석
면담 내용에 대한 분석은 사례별로 1차 면접 후 곧 바로 전사 작업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2차 면접 시 추가질문과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이루어졌으며 1차 분석이 끝난 후 두 연구자가 서로 교환하여 읽고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자료는 2명의 공동 연구자가 여러 차례 읽고 개별분석과 상호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이 완료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 와 Corbin(1990)이 제안한 지속적 비교분석방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패짓, 유태균 역, 2001:재인용). 지속적 비교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주제 영역을 도출하고, 주제들의 관계 및 구조를 구성한 다음, 각 주제 영역에 포함된 하위 주제를 발견하면서 자료 속에서 도출되는 중심 개념과 주제들을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방법이다(패짓, 유태균 역, 2001: 154). 구체적으로 분석은 첫째 단계-코딩, 둘째 단계-개념 도출, 세 번째 단계-개념의 범주화 순서를 밟았다. 코딩단계에서는 원래의 자료를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 개념, 주제 등을 추출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하였다. 개념 도출 단계에서는 이전 과정에서 부상한 개념이나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상호관련요소들을 통합하고 이에 대해서 의미있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개념의 범주화 단계에서는 도출된 여러 개념들 중 유사하거나 또는 의미상 관련 있는 것들을 통합하여 중심 주제(theme)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따랐다(그림 1 참조).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고 범주 및 해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박사 2명의 자문과 논의과정을 거치고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였다.
 그림 1.자료 분석 과정
그림 1.자료 분석 과정
IV. 연구결과
중년독신여성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관련한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31개의 개념, 9개의 하위범주, 3개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우선 중년독신여성들의 노화에 대한 경험은 나이 듦의 편안함과 막막함이라는 양가적 감정으로 분석되어졌다. 다음으로 중년독신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일, 관계, 꿈, 몸과 마음의 건강의 4가지 측면으로 구분되어 분석되어졌다.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는 생각해본 적 없음부터 생애과정상의 현실적 준비까지 연속선상으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 발견된 개념들을 범주화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개념들의 범주화
표 3.개념들의 범주화

1. 노화에 대한 경험: 나이 듦의 편안함과 막막함
노화가 어떻게 경험되는 가는 노년생활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노화를 수용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미래의 노년생활에 긍정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보이는 집단과 부정적인 경험을 보이는 집단으로 양분화 되었다.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 4, 사례7은 노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들은 나이 들면서 심리적 편안함과 여유가 더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화를 통한 심리적 변화에 대해 “뾰족뾰족한 마음”이 줄어드는 것, 삶에 “안 쫓기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례 5와 6은 “될 수 있으면 노인이 안 되고 싶다”는 식으로 노화를 부정하거나 노화에 따른 불안, 외로움, 우울증 등의 부정적 감정을 호소했다. 이들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배경에는 ‘여성독신’이라는 신분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자녀양육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자가 되고, 부모/조부모가 되는 역할의 변화에 따라서 노화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혼자들의 경험이라면, 독신 참여자들은 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통로가 부재하기에 노화에 대한 수용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정서적 문제를 가질 수도 있음을 표현했다.
또한 중년의 여성독신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위도 노화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로서 지적되었다. 스스로 경제를 책임지고 끊임없이 경쟁해서,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나이와 더불어 지속된다는 것은, 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부정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례 5와 6이 자신의 노화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이들이 대학 강사라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경력으로 가져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할 새로운 가족이 없는 ‘독신’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가족을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오랫동안 감내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연습과정이 없는거예요. 나는 그 연습과정을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결혼시키고 손녀를 통한 할머니의 역할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지. 그게 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내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는 거지. 누가 “아주머니” 이렇게 불러도, ‘내가 진짜 나이가 많이 들었는가 보다’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우리는 그런 역할이 없다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없어. 단지 사회에서 나이가 많아서 일들이 밀림으로써, 나이로만 계산하니까 그렇잖아. 그러다보니까 갭이 너무 크니까 정신적인 우울감도 많고. 만족감이 낮아.(사례 5)
사회에서 필요함의 정도가 줄어들고 있구나, 사회에서 나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나이가 들었다고 젊은 아이들에게 밀려나고 있구나, 일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것, 허함, 내가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사례 6)
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중년의 독신여성들인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소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삶의 부벽이자 존재의미로서의 일하기; 가족 밖에서 사람 울타리 만들기; 꿈을 실현하거나 취미활동하기;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인 되기.
1) 삶의 부벽이자 존재의미로서의 일하기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통한 경제력의 확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일이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의 의미이다. 경제적 자립은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노년생활 설계의 핵심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된다. 다만 중년의 독신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은 기혼자들과는 달리 더 절실한데, 앞서 지적된 것처럼 경제적으로 의존할 배우자가 없기에 오롯이 혼자서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노년의 질병 시에 돌봄을 제공할 자식 대신, 고용하게 될 케어제공자에 대한 비용부문까지 감안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력의 확보가 절실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생활을 꾸려갈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무너지면 보기보다 사람이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정신력도 같이 약해져요.(사례 2)
내가 나중에 누워있을 때 내가 마음 편하게 물이나 무엇을 갖다달라고 할 수 있는 간병인 정도는 쓸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좋겠어요.(사례 3)
‘일’이 경제적 자립의 수단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독신인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의 존재감을 지탱해주는 지지대로써 작용하고 있었다. 기혼자들에게 배우자와 자식이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로서 작용한다면, 이러한 관계가 없는 미혼의 독신 참여자들은 삶의 의미를 ‘일’에서 찾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일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는 사례 1의 언급과 “우선 일이예요. 일밖에 없어. 나는 일이 없다면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이에요”라는 사례 6의 언급은 미혼의 중년독신들에게 ‘일’이 단순한 경제력 확보를 넘어서서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수단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가족 밖에서 사람 울타리 만들기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들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확보 및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인간관계로써 가족이나 혈연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많지 않았다. 연애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형성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고, 기존의 출생가족이나 친인척도 자신의 성공적인 노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로 간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관계보다는 친구 및 이웃, 혹은 사회적 동료들이 자신의 노년을 함께 보내고 심리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친구 없으면 안 되는...가족이 아니라 친구. 나는 가족이 아닌 거야. 사람들은 그걸 가족이란 테두리로 정하는데 나의 소중한 것들 적어봤는데 가족이 아니라 친구가 들어가는 거야.(사례 1)
괜찮은 배우자라는 게 저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지금까지 못 만났으니 못 만날 가능성이 많기에. 그게 안 될 때는 공동체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씩 만들어 가든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든지.(사례4)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면...그렇다고 가족과 단절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크게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는 이렇게 해달라는 식의 기대는 안하겠다.(사례 7)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의 언급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연구들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특히 자식관계와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을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 규정하고 있다(김미혜·신경림, 2005; 김동배, 2008). 그러나 본 연구의 독신 참여자들이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을 지적한 것은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인간관계를 가족관계 밖에서 추구하는 점은 기존 연구와 다른 차이를 보이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과의 어울림이나 가족관계를 통한 심리적 만족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다는 점, 오히려 친구 및 지인과 같은 가족관계 밖의 사적 관계망의 유지에 더 노력을 쏟는 점, 더 나아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모임에 자발적으로 들어갈 것을 계획하고 있는 점이 중년독신 참여자들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인간관계라고 요약할 수 있다.
3) 꿈을 실현하거나 취미활동하기
본 연구에서 독신의 참여자들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나 취미생활의 향유였다. 이 점은 노년생활이 성공적인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지적되었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기 혹은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부터 자신이 오랫동안 추구하던 이상과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그 꿈의 실현이 노년생활의 ‘성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사례1은 오랜 유학 생활 후 현재 교수직 지원과정에 있고, 학문을 통한 자기실현을 성공적인 노년의 모습으로 설계하고 있었다. 사례2는청년기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명상이 힘과 안식을 주는 “은신처”로써 작용해왔음을 피력하면서, 명상과 함께 하는 노년은 성공적일 수 있음을 확신했다. 사례 3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소설가로서의 꿈을 이제 막 펼쳐보면서 글쓰기 학습을 시작하였고 “한 10년 안에 소설가로 등단하면 내 인생은 꿈을 성공”한 것이며, 소설쓰기가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궁극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4는 뜻과 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자급자족하는 시골 공동체를 성공적인 노년의 자기 모습으로 설계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 제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께끔. 밭도 가꾸고, 귀농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급자족해서 살면서 나랑 말이 통하는, 내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뭐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어울리다 보면 즐거운 사람들이 있거든요...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면서 자급 자급해서 사는 거요.(사례 4)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했던 꿈을 현실로 실현 시키는 것 외에 또 다른 연구 참여자들 (사례 5, 사례 6, 사례7)은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하는 등 직업 외에 사회적 활동의 영역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성공적인 노년생활을 한 영역으로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취미생활에는 여행, 문화생활, 원예 등의 활동이 포함되었다. 여가나 취미활동의 실현은 중년독신여성들의 현 삶의 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권미형 외, 2009). 또한, 실제 중년독신여성들의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참여도가 기혼여성이나 남성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통계청, 2011)은 이 영역이 중년독신여성들의 성공적 노화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확인해준다.
4)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인 되기
신체적 건강은 성공적 노화의 기본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신체건강을 성공적 노화의 당연한 요소로 지적하였다. 단지 이들은 독신이라는 신분으로 “혼자 살아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돌볼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혼자들보다 더 신체건강에 유의해야 된다는 점에서 신체건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신체건강 보다 연구 참여자들이 보다 더 자주 강하게 지적한 것은 노인이 되었을 때 타인의 시선에 드러나는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 이미지로 형성되는지를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이 되었을 때의 긍정적 품성이나 외모적인 면을, 성공적 노화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우선 참여자들은 우리사회 기존 노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많이 지적하면서, 노인들의 부정적인 품성을 자신들이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에 대한 근심을 우선적으로 표현했다. 참여자들이 지적한 노인의 부정적인 모습은 극단적으로 비생산적이고 의존적인 “산송장”, “폐쇄적이고 답답한” 존재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들을 상기하면서 닮고 싶은 긍정적 품성을 진술하거나, 별개로 “괜찮은” 노인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지적한 노인으로서의 건강한 품성과 마음은 안정신 외(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심리사회적 안녕’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늙을수록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고 그래요. 그 집착이 강해지니까 움켜쥐고 싶고, 베풀고 싶지 않겠죠. 나는 그렇게 안 늙고 싶어요. 그렇게 될까봐 불안하고…(사례 3)
자기 자신을 꾸미는, 화려한 옷은 아니지만 화장도 하고 단정하게 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활동적으로 걸어가는...건강하신 분이 곱상하게 화장하고 친구 분들끼리 극장에 와서 영화 보러 온 분을 보면 멋있다는…(사례6)
3.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 생각해 본 적 없음부터 현실적 준비까지
중년독신 참여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와도 연관되어 언급되어졌다. 따라서 중년독신 참여자들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분석되어졌는데, 생각해 본 적 없음부터 관념상의 준비, 생애과정상의 현실적 준비까지로 분석되었다. 이들 3개 영역은 개개인별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중복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독신 신분이 주는 득과 실이 또 다른 분석주제로 나타났다.
1) 생각해 본 적 없음
참여자들에게 노년생활, 노년생활에 대한 준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얼마정도의 침묵이 지난 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 첫 반응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보통 노년을 생물학적 나이 70세 이후의 삶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현재 40중후반의 그들에게 노년은 곧 다가올 가까운 현실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먼 미래로 여겨지기에 노년생활에 대한 준비는 생소한 질문으로 여겨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참여자들은 스스로 구체적으로 자각하지는 못했지만 노년생활에 대한 준비를 어떤 형식으로든 일상적으로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 관념적 준비
노년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다고 응답했던 참여자들도 대부분 노후에 직면하게 될 직접적인 문제인, 질병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관념적이나마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독신이고, 노후까지 독신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육체적 질병과 죽음에 대하여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 할 사람이 결핍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었다. 아플 경우 가족이 아닌 간병인이나 노인 병원을 이용하는 것(사례1과 사례3), 자식이 없을 것에 대비해서 자신의 노후를 간헐적으로 지켜봐줄 조카나 친구의 자녀들, 혹은 또 다른 대리인을 계획할 것에 대한 생각(사례1, 사례2, 사례3)을 막연하게나마 정리하고 있었다. 독신인 연구 참여자들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생각의 정리를 가장 우선적인 노후에 대한 준비로 여기게 되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이기에 저절로 그런거에 생각이 닿아진”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아프면 어짤고, 돌봐줄 사람 없고, 이런 생각은 제일 먼저 정리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돈줘가지고. 우리가 아플 때 되면 노인병원이 휴게소 아니겠어요.....그라고 또 그런 면에서 화장해라고 할거고. 돈이 몇 푼 남으면 화장한다고 뒤처리 해준 애보고 니 하라 할거고...그게 내가 혼자 사니까 더 그런 것에 신경을 쓴거 같애요. 나도 모르게. 그런 면에서 지저분하게 봐라봐라 저러니까 늙으니까 결혼해야 돼 이 소리 안 들어야지. 혼자 살아도 저렇게 별 그거 없이 하네. 그게 의지가 있어야 되거 든요. 자식이 있으면 어리양 부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나는 혼자 의연하게 죽고 싶어요.(사례 3)
3) 생애과정상의 현실적 준비
관념적으로 질병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면, 현실적 준비란 주로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과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는 일정한 시기에 특별히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노년생활은 따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맞이하는 삶의 단계가 아니라, 개별 삶의 여정에서 목표로 한 과업을 수행하고 난 후, 자연스럽게 다음 과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생애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몇몇 사례들에서 이러한 점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사례 1과 사례 2는 모두 교사로서의 오랜 직장경험을 통해연금을 보장해주는 위치에 있는 것이 경제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었고 이것을 노년생활에 대한 준비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례3은 40대중반까지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전력투구해왔고, 40대 후반인 지금은 경제력획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위해 오랫동안 꿈인 소설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생애과정에서 안정적 직업으로 경제력을 확보한 사례 외에 다른 연구 참여자들(사례4, 사례6, 사례7)은 40대에 접어들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노년을 위한 현실적 준비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연금 및 각종보험에 가입해서 건강과 경제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노년기의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현재 배움을 진행하고 있었다.
보험을 여러 군데 들어 두었어요. 이쪽저쪽에서 보충해서 보장받게끔. 이쪽에서 안되는 거, 저쪽에서 보장받고...여러 가지 안정성을 좀 두껍게 하려고요.(사례 7)
그리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신체적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나씩 하고 있었다. 또한 사례 2와 같이 명상과 마음공부로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거나, 사례 5는 인간관계를 확대시키는 것을 통해서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경우이다.
동호인이라든지...그런 식으로 조금씩 넓혀가는거죠. ###당이나 이런 쪽으로 후원 같은거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어 나가야죠.(사례 5)
4) 독신의 득과 실
경제적 안정과 심신건강을 위한 현실적 준비는 결혼과 상관없이 기혼자들도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독신이라는 신분은 이러한 노년준비를 위해 득이 되기도 하지만 실이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에 따라서 독신이 자식이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 없이 혼자서의 꿈을 좇을 수 있는 자유로움을 보장해주는 신분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보살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가족에 의해 책임을 부여받는 처지에 직면하기도 했다. 전자의 사례로는 연구 참여자 3을 들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잘랐다 부쳤다 하고 이래 살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게 배우자나 자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애가 공부를 하고 객지 서울에 대학을 가면 무조건 돈벌어서 부쳐주고 하고 그렇잖아요. 난 그런 면에서 좋아요.(사례 3)
사례 3이 독신의 자유로움을 대표하는 연구 참여자라면 이와 비교되는 반대 사례는 연구 참여자5를 들 수 있다. 사례 5의 경우, 독신은 “독신이니까 다른데 돈쓸 곳이 없는” 존재로 출생가족들에게 인식되어 출생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했다. 결국 사례 5는 독신이라는 신분이 자신의 노년준비를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40대 초반부터 쭉 (노년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주변 상황에 제가 맞춰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만 잘살겠다고 움켜쥐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사실은 저같은 경우에는 독신으로 살다보니까 좀 더 일찍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죠.(사례 5)
위에 언급된 사례 5처럼 독신이라는 신분 때문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독신이라는 신분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한 형제자매들을 대신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즉 네 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생존하신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었고, 함께 동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일상적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독신이 주는 이점 보다는, 독신이라는 이유로 떠맡게 되는 반갑지 않는 책임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년의 미혼 독신자들이 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성공적 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성공적 노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가진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걸친 7명의 독신여성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는 총 3개의 주제인 노화에 대한 경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로 범주화되었다. 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의의와 사회복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독신여성들의 노화의 경험은 편안함과 막막함이라는 양가적 감정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노화와 더불어 긍정적인 자기상을 발견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에 반해 독신이라는 신분으로 결혼과 그 연속선상의 경험부재로 인해 노화에 대해 부정하거나 수용이 어렵고, 혼자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불안정이나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중년독신여성에 대한 통계(통계청, 2011)는, 기혼여성보다 중년독신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절반 수준으로 낮고, 문화생활의 향유도 높으며, 사회적 관계망형성도 더 좋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년독신여성들의 삶의 질이 기혼여성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통계적 수치와 무관하게 중년의 독신여성들이 경제적 책임을 공유할 배우자가 부재하고, 결혼경험의 부재로 인해서 기혼여성들의 경험과는 다른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년의 독신여성들이 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겪는 독특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고학력으로서 심리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 지향적 문화 속에서 독신으로서 가지게 되는 심리정서상의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인구학적으로 독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독신자들의 정신건강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사회의 정신건강과 맞닿아 있다. 개별적인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중년독신들이 함께 서로의 문제를 공감하면서 해결할 수 있게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개입도 하나의 방법이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인 중년독신여성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4개의 하위범주-삶의 부벽이자 존재의미로서의 일하기, 가족 밖에서 사람 울타리 만들기, 꿈을 실현하거나 취미활동하기,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인되기-로 도출되었다. 이 중에서 ‘가족 밖에서 사람 울타리 만들기’는 기혼의 노년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에서는 제시되지 못했거나 강조되지 못한 영역이다. 특히 인간관계 측면에서 기존연구들(김미혜․신경림, 2005; 김동배, 2008)이 자녀와 배우자 만족을 성공적 노화의 중요 지표로 지적하는 것에 반해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족관계 밖’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서 이 부분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혼과 미혼의 확실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꿈의 실현이나 취미활동하기’로 범주화된 본 연구의 결과는 김동배(2008)의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서 나타나는 ‘자기완성’, ‘적극적 인생 참여’, 그리고 김미혜․신경림(2005)의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서 언급된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혼자나 독신자나 모두 성공적 노년생활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취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공통된다. 차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기효능감을 느끼고 자기완성을 통한 성공적 노화를 다른 영역을 통한 성공적 노화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공통된 배경, 즉 고학력 독신자라는 신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년기 성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는 개인적 성장과 삶의 의미추구가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난다고 논의하는 박경란․이영숙(2002)과 최인영(2007)의 연구와 일치된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 및 인식은 문화별로 다르게 규정되는 것이 공통적인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Thomas & Chambers, 1989). 결혼지위와 연령차이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중년독신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기혼의 노년기 성인들과 다른 지점들이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존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척도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중년독신여성들의 관점을 반영하여 재구성되어져야 한다.
셋째, 중년독신여성들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는 노후의 죽음이나 질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관념적으로나마 계획해보는 것과 노후의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경제력의 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크게 두 측면으로 나타난다.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고학력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보다는 경제적 독립과 실질적 노후대비에 대한 욕구가 더 절실하게 나타난다는 양은주(2005)의 논문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년독신여성의 노후준비의 양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적이나마 중년독신여성의 노후준비에 대한 양상과 그 과정에서 독신의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를 가진다.
성공적인 노년생활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독신의 영향은 양가적으로 나타난다. 독신이라는 조건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의 면제와 자유로 작용하여, 성공적 노년생활을 위한 스스로의 꿈 실현과 경제력 확보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도록 이끄는 촉진제가 된다. 그러나 정반대로 독신이라는 조건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여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를 방해하는 경험도 언급되었다. 즉 책임져야할 배우자나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출생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더 많이 부여받는 경우, 특히 생존 부모의 일상에 대한 책임을 다른 형제자매에 의해 암묵적으로 부여받는 경우는 오히려 독신여성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경제력 확보를 방해받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족사적인 배경 외에도 사회적으로 남녀차별임금이나 배우자연금혜택의 제도들은 독신여성들의 노후를 위한 경제력 확보가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독신여성들의 인구학적 증가추세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복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중년의 독신여성들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chulz와 Heckhausen(1996)는 성공적 노화를 노년기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일생을 성공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으로서 보는 생애주기관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는 노년기가 아니라 매 생애과정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주로 노년층에 국한되어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년독신여성들이 ‘독신’이라는 이유로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기혼자와는 다른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상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결혼경험이 없는 고학력 중년독신여성들에게 국한된 연구이기에, 같은 중년의 독신이라고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이혼 후 다시 독신가구를 형성한 경험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본 연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 의 시작 전에 만나 본 중년 남성 독신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여성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지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달리하는 중년독신들에 대한 노화의 경험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의 연구가 별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후속연구로써 중년독신여성들이 어떻게 노후준비를 하고 있고, 독신으로 노후 준비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인구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년독신여성들의 건강한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이다.
Reference
2.고정옥·김정숙(2009). 중년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생활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3), 17-39.
3.권미형·김분한·김윤정(2009). 중년 미혼 여성의 삶의 만족감에 관한 주관성 연구. 주관성 연구, 18, 101-123.
4.권중돈·김동배(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5.김동배(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6.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7.김미혜·신경림(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8.김숙자(2003). 중년후기여성의 노년기 전환기 경험. 여성가족생활연구보고서-3,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65-85.
9.김은설(2009). 우리나라 미혼 성인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식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10.김인숙(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김태련·장휘숙.(1998). 발달심리학: 태내기부터 성인후기까지. 서울: 박영사.
12.김혜영·선보영·김상돈(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 고서, 18, 1-277.
13.데보라 K. 패짓 저. 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14.박경란·이영숙(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15.박금자(2002).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와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2). 232-243.
16.박정희(2007).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 중년여성의 노후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박형숙·김상금·조규영(2003). 일지역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 우울,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4), 479-488.
18.보건복지부(2010). 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
19.한국노동연구원(2011). 학력과 경제활동상태로 본 40대 미혼. 노동리뷰, 78, 78-100.
20.송석전(2003). 중. 장년층의 노후준비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심경미(2002). '비혼(非婚)' 여성에 관한 연구 : 30대 중반 이후 40대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비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안정신·강인·김윤정(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25-245.
23.안현선·김효민·안진경·김양희(2009).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37-155.
24.양은주(2005). 고학력 비혼 취업 여성의 일과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5.유수민(2006). 미혼여성 42 '결혼 안해도 돼'. 보건복지부.
26.윤현숙·유희정·이주일·김동현·김영범·박군석·유경·장숙란(2008). 인생의 보람과 후회: 성공적 노화여부에 따른 비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4), 5-35.
27.채재희(2010). 중년 미혼여성의 삶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결혼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 정관리학회지, 23(2), 1-10.
29.최인영(2007).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0.통계청(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31.하보란(2012).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홍현방(2002). 성공적 노화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3.Baltes, P.(1993). The aging mind: potential and limits. The Gerontologist, 33, 580-594.


34.Erickson, E. H.(1994).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35.Fredrickson, B. L. & Carstensen, L. L.(1990). Choosing social partners: How old age and anticipated endings make people more selective. Psychology and Aging, 5, 335-347.


36.Havighurst, R. J.(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37.Neugarten, B. L.(1968). Middle age and aging. Chica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8.Rubin, A., & Babbie, E.(2001). Research method for social work. Belmont: Wads worth.

39.Rowe, J., & Kahn, R.(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40.Schulz, S. & Heckhausen, J.(1996). A life span model of successful aging, American Psychologist, 51(7), 702—714.


41.Straudinger, U.M. & Bluck.(2001). A view on midlife development from life-span theory. In M.
42.Lachman, M. E.(2001).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43.Thomas & Chambers.(1989). Successful aging among elderly men in England and India: A phenomenological comparison In L. E. Thomas(ed), Research and Adulthood and aging: The Human Science Approach 183-203.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44.Troll, L. E.(1982). Continuations: Adult development and aging. CA: Brooks-Cole.
45.Verena, H. M. (2003). The relation between everyday activities and successful aging: A 6-year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 S74-S82.